2022. 12. 7
‘농촌 어린이 시집’ 『일하는 아이들』은 이오덕 선생이 1958년부터(1952년 것도 한 편 들어가 있다) 1977년까지 20년 동안 주로 농촌 아이들과 함께 쓴 시를 그때그때 모아두었던 것을 엮은 책이다. 지난날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을 품은 시집이라는 드문 책이지만 으레 작고 연약한 것을 굽어보는 나쁜 버릇이 발동해(티나지 않게!) 은근히 업신여기며 한쪽으로 미뤄두고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이오덕 선생의 발자취를 뒤쫓다보니 자연스레 이 책을 펼치게 되었다. 「고침판 머리말」을 읽자마자 한동안 넋을 놓고 말았다. 단박에 여러 꼭지를 읽지 못하고 한두 꼭지정도만 겨우 읽고 오래도록 뒤척인 탓에 책을 읽는 방식을 바꿔보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야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맑은 바람을 쐬고 싶거나 머리가 복잡해 갑갑증이 일 때 곁에 두었던 이 책을 펼쳐 서너 편씩 읽는 방식으로 말이다. 꽃에 내려앉은 나비를 자세히 보거나 나뭇가지 위에 앉아 노래하는 새의 지저귐을 들으려면 가만히, 천천히, 나지막하게, 할 수 있다면 몸을 작게 말아두고, 숨소리도 가지런하게 내뱉어야 하는 것처럼 ‘일하는 아이들’이 쓴 시를 읽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하지만 매번 이 책을 펼친 것은 지난날 농촌 아이들의 시를 읽기 위해서라기보단 그 시에 관해 책 한 귀퉁이에 눈곱처럼 작게 쓴 이오덕 선생의 글 때문이었다. 으레 읽어온 ‘해설’ 따위와 달리 시를 두고 말하기에 앞서 시를 쓴 아이들의 저마다 다른 형편을 두루 살펴 그 아이의 자리에서, 그 아이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쪽글이 마음 깊이 들어왔다. 바로 잡지 않아도 충분히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오히려 그대로 두었을 때 생생하게 살아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사투리, 때때로 외국어 번역에 가까울 정도로 생소한 말풀이도 눈길을 끌었지만 그보다 깊이 자리한 것은 농촌 아이들의 고단한 생활과 맑고 솔직해서 깨끗하고 단단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오덕 선생의 눈길과 손길에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익히고 배운 나날이 짧은 글귀 속에 모짝 펼쳐져 있었다. (“이러고 보니 이 책이 바로 저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333쪽) 일하는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이오덕 선생의 글귀에 그대로 맺혀 있는 듯했다. 여전히 이오덕 선생의 길잡이 글에 기대지 않고선 아이들의 ‘노래꽃’(국어사전[노랫말꽃]을 쓰며 전남 고흥에서 숲살림을 지어온 최종규 님은 동시를 노래꽃이라 부르기에 이곳에 옮겨본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책의 너른 마당은 모두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끄트머리에 눈곱처럼 작은 글씨로 적바림해둔 이오덕 선생의 글을 읽으며 ‘해석과 비평’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더 그럴싸한 말로 재주를 부리거나 자못 홀로 어렵사리 깨친 무언가를 뽐내려는 듯 괜히 어려운 말로 꼬아 두는 내 글쓰기 버릇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속으로 앓는 소리를 내어가며 이오덕 선생의 쪽글을 읽고, 다시 스스로를 나무라며 아이들의 시를 읽었다. ‘뚜렷한 말로 생각과 느낌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것’, 이를 글쓰기라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왔지만 아무래도 쭉정이 같은 생각을 떠들썩하게 주억거려온 듯하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꾸밈없이 쓴 것을 나는 제대로 읽을 수나 있는 것일까? 제대로 듣고, 매만지고, 품고, 매듭으로 엮어 가지런히 놓아두거나 쟁여둘 수 있는 것일까? 내 형편과 깜냥으론 읽을 수 없는 말과 글을, 마음과 뜻이 맺혀 있는 누리를 이오덕 선생이 매만진 글에 기대어 더듬거리며 겨우 반 발짝, 때론 한 발짝 내딛어볼 뿐 달리 방법이 없다.
이오덕 엮음, 『일하는 아이들』(보리, 2002/초판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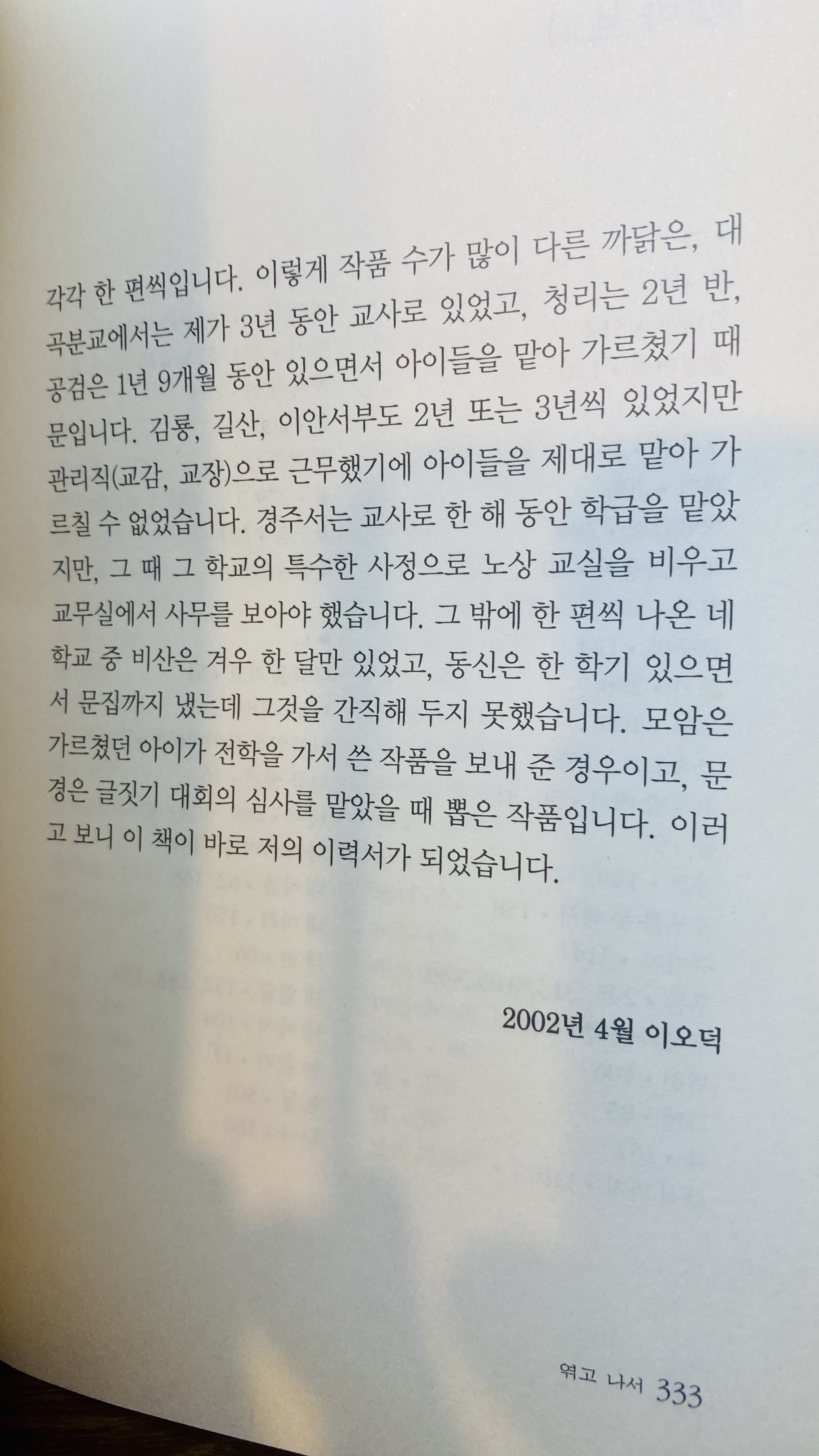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난이라는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 (0) | 2023.07.19 |
|---|---|
| 흐트러짐 없이 사위어가는 것 (2) | 2023.01.24 |
| [출간 일지] 아이처럼, 바람처럼, 메아리처럼 (0) | 2019.04.24 |
| 출간 일지 _메모 2019. 4. 20 (0) | 2019.04.22 |
| 좌절됨으로써 옮겨가는 이야기 (0) | 2016.01.06 |



